우동은 우동이다, 이것을 달리 뭐라고 부를까
[시인 박준의 酒방] 망원동 즉석우동
식당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메뉴판에 적힌 음식 재료나 요리 이름을 반복해서 발음해 볼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이름이 낯설어질 때가 있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이름이 붙게 됐을까 하고 감탄하게 될 때도 있다. 음식마다 유래와 어원은 따로 있지만 음성학적으로만 봐도 두부는 정말 두부라고 불러야 할 것 같고 매생이는 매생이가 아니면 달리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우동도 그렇다. 나는 ‘우동’ 하고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모이는 모양을 좋아한다. 이때 입 모양은 마치 한 가닥 남은 면발을 호로록 빨아들일 때와 꼭 닮았다. 우동은 사실 외래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가락국수로 표기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말이다.
우동이라고 했을 때 대개 우리는 고명, 육수, 반죽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따라붙는 일본 음식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 대신 고속도로 휴게소나 포장마차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한국식 우동을 먼저 생각한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진한 멸치 육수에 고춧가루를 풀고 면과 유부를 건져 먹는.
이런 우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봐도 좋을 곳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곳은 우동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반가울 곳이다. 서울 합정동이나 홍대 인근에서 술 약속이 있는 날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성산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망원동 즉석 우동. 이곳 점심시간은 인근 직장인들로 붐비고 새벽 시간은 서울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메뉴는 우동과 돈가스, 어묵과 어묵 우동으로 단출하지만 부족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곳에 우동을 먹으러 간 것이니까. 청양 고추로 만든 다진 양념과 쑥갓이 들어 있는.
늦은 새벽 진하고 따뜻한 국물을 만나는 일은 마냥 반갑다. 게다가 헤어지기 아쉬운 좋은 사람들과 많이도 말고 술을 한 병만 더 앞에 두고 차분하게 마주하는 시간도 누릴 수 있다. 유예 같은 혹은 덤 같은 시간. 우리 얼굴보다 더 큰 그릇을 들고 훌훌 국물을 마셔가며. 그러고는 그릇을 내려놓고 상대를 향해 작게 웃어 보이기도 하며. “상반신이 점점 펴지더니 껴입은 외투에서도 뜨신 김이 피어오른다 여자가 떠난 자리 바닥난 우동 그릇 하나 무엇이라도 다 품을 듯 충만하게 비어 있다”(‘우동 한 그릇’)는 시인 문성해의 문장처럼 속을 채워가며, 마음을 비워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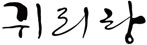

댓글쓰기